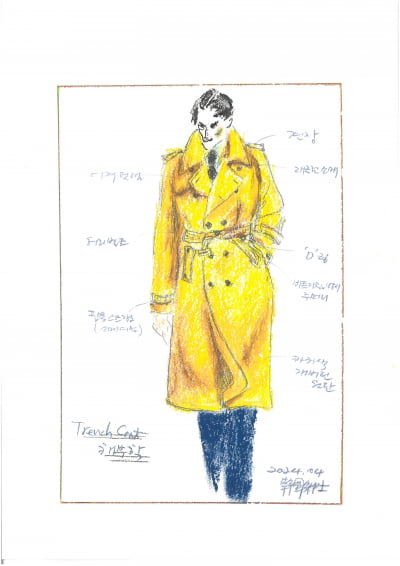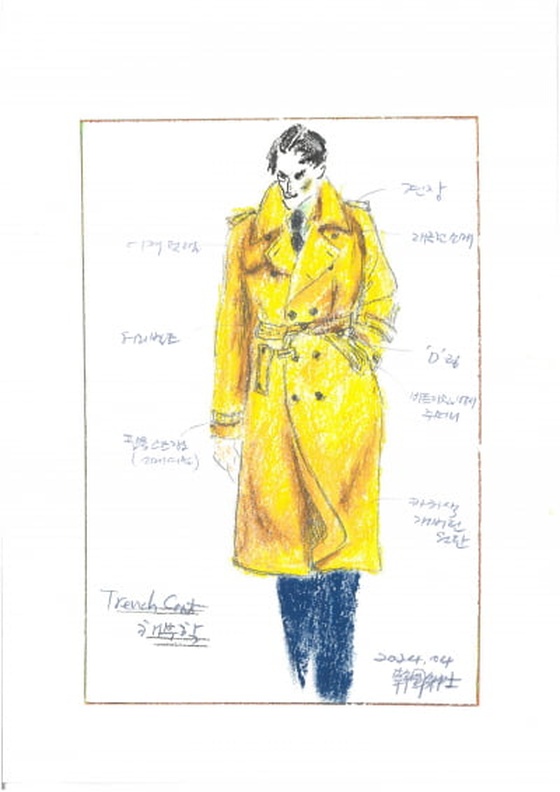[책마을] "위기 겪는 유로존 국가들…잔류만이 능사 아니다"
한스베르너 진 지음 / 이헌대 외 옮김 / 한티미디어 / 510쪽 / 2만5000원
![[책마을] "위기 겪는 유로존 국가들…잔류만이 능사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746121.1.jpg)
유로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성장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로가 통화권을 평준화하고 저금리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자본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유럽 자본이 남유럽으로 흘러가면서 투자수익률을 높여 유럽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를 저버렸다. 남유럽 국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 요구로 피로를 호소하고, 독일을 비롯한 채권 국가들은 재정지출로 인한 자국 내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유로존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다.
저자는 “유로존에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해 유로지역 국가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진정 돕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이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얻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청년층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리스와 스페인이 유로존에 잔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 나라의 한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국가 의회가 임금 삭감을 포함한 사회적 개혁과 유로존 탈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어떤 나라가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면 회원국 공동체는 그 나라가 순차적인 과정을 밟아 탈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국가 은행들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한 도움을 주고, 해당 국가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동체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로존을 탈퇴한 나라가 영원히 떨어져나가는 불명예를 얻어선 안 된다는 게 진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복귀할 권리를 지닌 준회원국을 인정하는 통화동맹이 만들어지면 준회원국은 경쟁력을 회복하느라 힘을 빼는 대신 경제적 고질병과 대량실업을 피하면서 환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유럽의 경제 시스템이 미국과 스위스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과 스위스에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지방정부가 지나친 채무를 지면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파산이란 옵션이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긴장감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진 교수는 “지나친 자본 이동을 예방하는 구조가 없다면 통화동맹은 스스로 안정될 수 없다”며 “의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맞는 현실적 해결책과 자산의 강제적 재분배 없이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