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위기의 자영업(下) - 어설픈 보호가 모두를 죽인다
각종 지원법이 성장과 혁신 차단
이대론 내수산업 발전 불가능해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위기의 자영업(下) - 어설픈 보호가 모두를 죽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0/02.6926659.1.jpg)
월마트가 진출한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초토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월마트는 경쟁자에 비해 40%나 생산성이 높았다. 당연히 가격이 쌌다. 바코드 같은 신병기로 무장한 터였다. 유통산업은 컴퓨터화되었다. 시어스로벅이 20세기 초 컨베이어벨트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후 제2차 물류 혁신이었다. 월마트가 들어간 도시는 물가가 13%나 떨어졌다. 이 13% 구간에 속하는 업자들은 초토화되었다. 나중에야 월마트가 미국인에게 가져다준 행복이 계량되었다.
맥킨지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 생산성 혁명의 4분의 1은 월마트 덕분이었다. 미국인들은 평균 2.3%나 부자가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2000억달러 이상이 미국인의 호주머니에 떨어졌다. 어느 정부도 못해본 일이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무덤에서는 곧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다. 수많은 자영업들이 평균 2.3%씩 부자가 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새로 문을 열었다. 신경제는 그렇게 태어났다.
월마트 경영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원가 후려치기였다. 폴로 티셔츠는 8달러로 납품가격을 후려쳤다. 결국 미국 공장이 문을 닫았다. 리바이스도 그랬다. 거대한 공룡 유통산업에 굴복하는 제조업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공장들은 모두 중국으로 옮아갔다. 아차!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다. 이제 중국에도 공장이 생겨나고 중국인에게도 직업이 생겨났다. 신은 그렇게 마오쩌둥의 구렁텅이에서 중국인을 구해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미 불러오지 않았던가.
자영업을 걱정하는 뇌는 실로 즉물적이요 천동설적이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PC가 만들어지면서 타이피스트가 없어지고 버스 토큰이 생기면서 안내양이 사라진다. 거꾸로여도 좋다. ‘양떼가 사람을 먹어치운다’던 비명소리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나.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는 약 550가지의 빵과 과자를 만든다. 동네빵집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판매망이 광역적이라야 가짓수가 따라온다. 이마트는 7만개 품목을 관리한다. 롯데마트도 비슷하다. 미국의 대형마트는 10만개다. 구멍가게 품목 수는 몇 개일까. 2000개에 미달한다. GS25는 대략 1만5000개를 관리한다.
당연히 대형마트 뒤에서 움직이는 생산업자들이 더 많다. 근로자도 더 많다. 이들의 거대한 협동체가 바로 대형마트다. 복잡성의 증진이 바로 산업의 발전이다. 내수경기 살린다는 정부의 백 가지 노력이 헛도는 것은 유통산업 발전을 틀어막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때문이요, 중소기업들이 이다지도 과당경쟁하는 것은 수백 가지 중소기업 보호조치 때문이다. 온갖 보호가 그들을 좀비화한다. 아니 모두가 모두에 대해 물귀신이 된다. 산업을 영세화하자는 것이 소위 보호론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식당 1곳당 고객 수는 겨우 86명이다. 일본은 161명이요, 미국은 329명이다. 이런 상태를 온존시키자는 법률들이 빼곡하다. 그게 동반성장과 골목 보호의 논리다. 보호할 것은 골동품이면 족하지 않나. 내수산업 발전이라는 말이나 하지 말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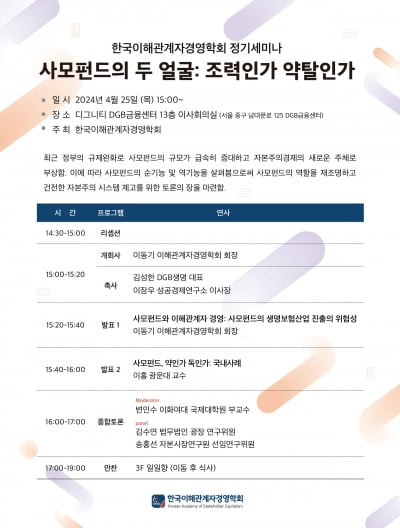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