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상 뜬 제 아이가 문학 선물해줬죠"
'마음오를꽃' 출간한 정도상 씨

소설가 정도상 씨(54·사진)의 새 장편《마음오를꽃》(자음과모음)은 청소년문학에서 보기 힘든 소재인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4일 서울 인사동에서 만난 정씨는 큰아들이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버린 아픈 가족사를 말하며 “자살할 사람은 하겠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계속 피하다가 2012년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자살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겪은 사람으로서 해야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인 우규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인생의 ‘재부팅’을 꿈꾼다. 엄마를 하느님처럼 여겨 ‘엄마느님’이라고 부르는 소녀 나래는 엄마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 결국 이 둘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승에서 만난다. 죽은 뒤 세계인 ‘가운데 하늘’에서 재판을 받은 두 영혼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보고 후회한다.
정씨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일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해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애니메이션 감독이 꿈이었어요. 단순히 자식이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작가는 “아이가 죽고 나서 문학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했다.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고 쌓이는 것이지만 내게 상처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그는 “아이가 나에게 문학을 선물해 문학의 근원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이달 하순부터 교육청 초청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할 예정이다. 정씨는 “내가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죽으면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마주치는지,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얘기할 것”이라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잘 죽는 것이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하이브, 민희진 등 오늘 고발…대화록 등 물증 입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1961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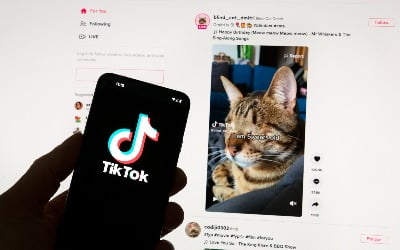
!["샤넬 백은 못 사도"…핫한 2030 언니들, 여기 다 모였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345.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