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는 막으면서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택배 대란' 오나
업계 "기사 이탈로 택배서비스 올스톱 될 것"
정부 "증차관련 법개정 용달업계 반대가 변수"
경기도 수원에서 4년째 택배 배달을 하는 유모씨(32)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내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자가용 택배 차량 신고포상제’(일명 카파라치제) 탓이다. 그의 택배 차량 번호판은 노란색(영업용)이 아닌 흰색(자가용·비영업용)으로 단속 대상이다. 유씨는 “배달하다 걸리면 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해도 월 200만원 정도 버는 상황에서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용 번호판을 사려면 1000만원 이상 드는 데다 그나마 구하기도 어렵다”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택배 차량 절반이 단속대상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달부터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택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배송 물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자가용 택배 기사들의 이탈로 이 지역의 배송 서비스가 마비되는 ‘택배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배 자가용 차량 배송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지난 8일 도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지사가 이달 말께 조례를 공포하면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울시도 내달 시행을 목표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불법’인 자가용 택배차량 배송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택배업계는 신고포상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자가용 택배 기사의 대량 이탈을 불러와 택배 서비스가 ‘올스톱’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택배 회원사 12개사의 택배 차량은 3만61대(우체국 택배 제외)로 이 중 49%인 1만4719대가 자가용이다. 경기도에 이들 자가용 차량의 23%, 서울시에 17%가 몰려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는 거미줄 형태의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장치산업”이라며 “시스템상 일부 조직이 무너지면 전체 택배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량 늘어도 영업용 증차 ‘제로’
택배업계에 자가용 차량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몰·홈쇼핑 시장 급성장에 따라 택배산업이 급팽창했음에도 2004년 이후 신규 증차를 허용하지 않은 정부의 화물차 수급정책 탓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차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반면 택배물량은 2004년 4억박스에서 지난해 약 13억박스로 7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택배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했고, 정부도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해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만성적인 차량 부족을 호소하며 택배 전용 자가용 차량 허용 등 증차를 요구해왔다. 용달업계의 반발 등으로 증차에 미온적이던 정부도 ‘택배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지난 4월 증차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정부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에 들어가면 집배송 서비스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달업계 “택배운임 현실화를”
화물차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내 택배 증차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하고 증차 대상과 대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차량 과잉 상태로 택배업 전환이 가능한 용달업계가 택배운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증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전국용달업협회는 “수년간 방치돼 온 불법행위를 이번 계기로 뿌리뽑아야 한다”며 카파라치제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을 풀어줄 게 아니라 택배업체들이 운임을 현실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정식으로 허가받은 용달차량들이 택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형/임현우 기자 toughlb@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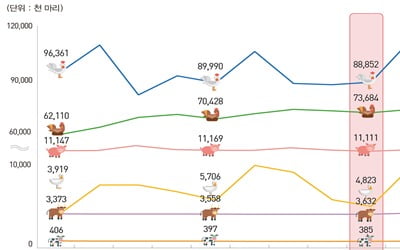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