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퀴즈쇼 정답? 전문가보다 방청객에게 물어라
英 황소무게 맞추기 대회, 추정 범위 중간값 계산하니 실제 무게와의 차이 1%뿐
'집단지성' 발휘된 사례 담아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라는 미국의 인기 TV 퀴즈쇼에서는 참가자가 정답을 모를 때 답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방청객에게 묻기’, 다른 하나는 ‘전문가에게 전화하기’다. 전문가가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통계를 보면 방청객에게 묻는 게 정답을 얻을 확률이 높다. 보통 평일 낮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이 쇼의 방청객들은 정답을 준 경우가 90%였지만 전문가들은 66%에 불과했다.
과학 칼럼니스트 렌 피셔의 《보이지 않는 지능》은 바로 이 ‘집단지성’을 다룬 책이다. 그는 천재적 개인의 ‘보이는 지능’보다 다수의 ‘보이지 않는 지능’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집단지성의 효용을 설명해주는 사례는 많다. 1906년 영국의 한 가축박람회에서는 800여명이 황소 무게 맞히기 대회에 참가했다. 사람들이 황소 무게를 추정한 범위는 1074파운드에서 1293파운드. 중간값은 1207파운드인데, 실제 무게인 1198파운드에서 1% 미만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이를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삼기도 했다.
런던의 건축가 맷 디컨은 106명의 회의 참석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421개가 든 유리병 속에 동전이 몇 개인지 추측해보라고 했다. 추측 개수의 범위는 넓었지만 평균치는 놀랍게도 419개였다.
저자는 이 같은 집단지성이 산업에서도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소매상인들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만 할 뿐 기업 자체가 중요한 형태의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모여 활발히 거래하게 해 이윤을 창출한다.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IBM이 무료 리눅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간 1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무모해보이지만 결국 군중과 제품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윤을 취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콩도르세는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배심원 정리’를 통해 민주적 정부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 이 정리에는 ‘집단 내 개인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로의 의견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집단 내 개인들은 편견이 없어야 한다’ 등의 필수 전제가 있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과정 속에서도 합리적 개인이 온전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예로 책 속의 실험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이 벽에 알파벳이 붙어 있는 방을 자유롭게 걷는 실험에 참가했다. 어느 쪽으로 걸어도 상관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생에게는 알파벳 B를 향해 가라는 추가 지시가 비밀리에 주어졌다. 걸음을 멈추라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학생들 대부분은 추가 지시를 받은 학생과 함께 B근처에 가 있었다. 집단은 ‘소수’에 휘둘리기 쉽다. 이는 개인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배심원 정리의 전제 조건을 뒷받침하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책은 흥미로운 예시와 설명들로 차 있지만 이들이 물 흐르듯 전개되지는 않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독자들은 오히려 각각의 경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주체적인 독서를 할 수도 있겠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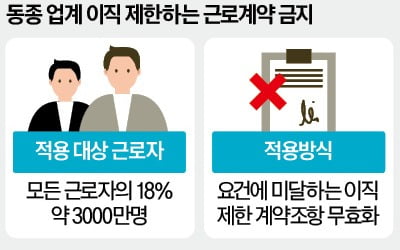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단편 '일러두기'로 이상문학상 수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12057.3.jpg)